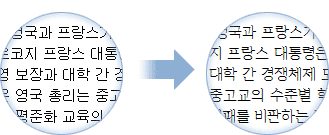문 화
“(왕비)지위에 오르니 사사로운 정 펴지 못해”
푸른물
2010. 4. 20. 06:45
“(왕비)지위에 오르니 사사로운 정 펴지 못해”
| 2007-02-09 03:00 | 2007-02-09 03:49 |
▽평생을 근신했던 왕비의 부모=오랫동안 궁중을 출입해 온 부친 김주신이 거의 매일 보는 나인의 얼굴을 몰라보자 인원왕후가 묻는다. “몇 해를 거의 날마다 보는 사람을 능히 알지 못하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그러자 김주신이 답한다. “신(臣)이 비록 딸을 받들어 궁중에 출입하오나 어찌 감히 눈을 들어 둘러보오리까. 또한 마음이 황송한고로 눈 가운데 스스로 보이는 바가 없나이다”라고 대답한다. 궁중에 들어서면 나막신의 목화 부리만 쳐다보고 길을 걷다 보니 나인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것이었다. ‘션비유사’에 따르면 왕후의 모친 조씨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궁 안에 머무르시면 새벽에 일어나시어 문 밖에 오셔서 내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청하여 ‘누운 자리에 들어오소서’ 하면 ‘황송하노라’ 사양하시고, 내가 청하여 자리를 한 가지로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머뭇거려 사양하시고, …궁인이 이르되 ‘여편네는 별로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 ‘여편네는 나라의 신하가 아니냐’고 대답하셨다.” 특히 조씨 부인은 궁중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과 들리는 말에 대해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았다. “더욱이 언어에 조심하셔서 바깥말씀을 일찍이 내게 전하시지 아니하시고, 안말씀을 들으셔도 듣지 않음같이 하시고, 여상궁배(상궁)로 더불어 비밀스러운 말들이 오고갈 것 같으면 즉시 문 밖에 나가 기다리시고….” 딸이 주는 하사품에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척촌만 한 비단 조각을 주려고 해도 반드시 강권한 후에야 받으시나 항상 떳떳지 못하게 놀라듯이 하시고 궁중에 내려오는 관례라고 해도 간절히 사양하시며 ‘과복한 재앙을 이루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하셨다.” 딸을 신하의 예로만 대하는 부모에 대해 인원왕후는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15세에 이르되 항상 무릎에 두시고 이마를 어루만져 잠깐도 버려두지 않으시더니 내가 이 지위에 오르자…내가 그 좌석이 너무 멂이 민망하여 가까이 옮겨가고자 하면 아버지께서는 종종걸음으로 물러나 사양하셔 내가 감히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했다.”(션군유사) 인원왕후는 부모에 대한 기록을 친정으로 보내 친정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하영 이화여대 교수는 “당시 왕의 처가 세력이 얼마나 근신하도록 교육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녹록지 않았던 인원왕후의 독서=세 번째 문집은 제목이 없고 ‘륙아뉵장’을 비롯해 세 작품이 수록돼 있다. 전체 분량이 950자인 이 문집은 크기(가로 7cm, 세로 12cm)가 요즘 담뱃갑보다 조금 커 휴대용으로 만든 소형 문학선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앞에 실린 ‘륙아뉵장’은 ‘시경(詩經)’의 ‘소아(小雅)·곡풍지십(谷風之什)·육아(蓼莪)’의 내용을 한글로 옮겨 쓰고 뜻을 풀이했다. 이 중 특별히 관심을 끄는 작품은 ‘노옹자탄직금도(老翁自歎織錦圖)’란 작품. 노년에 이른 삶을 탄식하는 내용의 한시인데, 아직까지 원전이 발견되지 않아 인원왕후가 노년기에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는 “세 작품은 모두 자녀로서의 효성과 아내로서의 덕성,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는 높은 차원의 글”이라며 “왕후의 독서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 문집의 저술 시기와 관련해 인원왕후가 ‘션군유사’를 쓰며 “노년에 이르러 오랜 병환으로 정신이 혼란한 때 이 글을 쓴다”고 밝힌 점을 들어 왕후가 70세로 세상을 떠난 1757년(영조 33년) 무렵으로 추정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인원왕후는 인현왕후 뒤이은 숙종 세번째 왕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1687∼1757)의 본관은 경주다. 경은부원군 김주신과 가림부부인 조씨의 2남 3녀 중 둘째 딸로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가 죽은 다음 해(숙종 28년) 10월 15세의 나이로 왕비에 간택됐다. 인경(仁敬), 인현(仁顯) 왕후에 이은 숙종의 세 번째 정비다. 실제로는 희빈 장씨에 이은 네 번째 비였으나 폐위된 장씨는 왕실기록에서 희빈으로 강등됐기 때문이다. 인원왕후는 궁중에 들어간 지 10년째인 숙종 37년 12월에 천연두를 앓은 것을 시작으로 홍진, 치통, 안질, 종기 등을 앓았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 숙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이 없었던 인원왕후는 영조를 친아들처럼 아끼며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인원왕후는 숙종, 경종, 영조 3대에 걸쳐 55년 동안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로 있으면서 왕실과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70세에 세상을 떠났다. 왕후의 능은 명릉(明陵)으로 경기 고양시 용두동의 서오릉(西五陵) 묘역 내에 있다. |
|
|
|